김용권 인문학강사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서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안도현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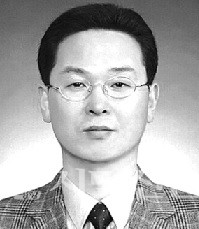
한정된 땅에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잘 자라게 하려면 오히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간격이 필요함을 불에 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시인은 알았다고 노래한다. 이것이 어디 나무만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간격(거리)은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흔히 서로 친해지면 형님동생 하며 말부터 놓기가 십상이다. 더 친해지면 의기투합해서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면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막역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는 그렇게 잘 지내던 관계들도 한 순간에 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특히나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는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적당한 거리(간격)를‘ 허물없음’이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무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이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고, 남들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도 간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사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제 뜻대로만 하려든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는 투로 상대가 허락하지 않는 사적 영역까지도 함께 해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쯤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섭섭함을 토로하며 멀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다. 너무 소원하면 멀어지기 쉽고, 또 너무 가까이 다가서려다간 관계를 그르치기 쉽다. 좋은 관계를 오래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그 ‘아름다운 거리(간격)’을 잘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이 지점에서 옛날 제(齊) 나라의 명재상 안영(晏嬰)을 평가하며 공자(孔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안평중(안영)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잘 사귀었는데, 그 까닭은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