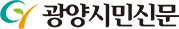4월 1일은 만우절이다.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 듯한 거짓말로 재미있게 남을 속이는 날이다. 또한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날은 멸종위기종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4월 1일 ‘환경보전법’을 통해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 고시한 날을 기념해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이날을 멸종위기종의 날로 정했다.
멸종은 한 생물의 한 종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생물의 한 종류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한다. 즉 과거 생존해 있던 종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개체가 확인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위기종이라는 말은 없애버림의 끝자락에 있음을 경고하는 단어다.
특히 서식지가 한정된 섬에서 서식하는 동물일수록 멸종되기 쉽다.
섬이라는 특성상 인간의 손길을 피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고립된 환경인 만큼 그 섬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고유종이 많다. 개체수가 적어 더욱 멸종에 취약한 것이다.
현재 생물의 멸종 위기는 대부분 인간의 개발행위에 의해서다.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는 개발행위 자체가 위협적이기도 하고 공장 가동 등 개발의 인과에 의한 기후 위기 등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시 매우 위협적으로 생물을 공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간에 의한 생물의 멸종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확산했다.
인간이라는 최상위 포식자는 다른 포식자들과 달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넘어서 매우 파괴적이면서도 집요했다. 현대의 들어서는 재화와 맞닿으면서 그 범위는 훨씬 넓고 피해 역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류는 현재 대멸종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과학계의 분석은 매우 엄중하다. 대멸종은 운석 충돌처럼 전 지구적 기후 급변으로 생존에 성공했던 생물종이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뜻한다. 지구 역사상 현재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데 인류에 의해 현재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암울하고 섬뜩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것은 사실 수십 년째다.
재화의 습득이라는 욕심을 위해 인류는 경고를 무시해왔다. 그리고 대멸종의 범위 안에 인류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범지구적 과제를 바로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일 뿐이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익 우선 앞에 수많은 산림과 습지가 거침없이 사라지고 있다.
재화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온 서식지가 속절 없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력공급을 내세운 한전의 무소불위 행태다. 우리지역에서 역시 한전은 거침이 없다. 백운산 송전탑 건립을 두고도 그러했고 구봉산 송전탑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아니 한전은 전국의 모든 전력공급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터전을 파괴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던 게 다반사 아니었던가. 하물며 생물의 서식지 파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멸종위기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 현재 한전은 노랑부리저어새 등 9종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세풍습지 보존 요구를 고스란히 무시한 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날이 참으로 쓰디쓴 이유다.
어떤 한 종의 멸종은 단순히 그 종에게만 위협적인 일이 아니다. 생태계 내 모든 종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 속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하나 현재 과학적 접근으로는 이 상호적관계가 미치는 영향의 범주를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 종의 멸종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불가의 현실을 인류는 반드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전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