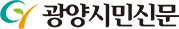尋牛圖심우도
황소 한 마리가 외양간을 꽉 채우고 엎드려 있는 것만큼 마음 든든한 광경도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따라 검둥이란 놈이 유난히도 짖어댔습니다. 한 십년 먹인 수캐였는데 매우 영리해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었지요. 한가지, 이 검둥이란 놈에겐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놈의 잠자리였는데요, 마루 밑에 마련해준 제 잠자리는 거들떠도 아니 보고 늘 외양간에 가서 잤습니다. 엎딘 소의 옆구리께에 턱하니 기대어 짚북더기에 코를 박고 잤는데요 그날은 동네 암캐라도 쫓다 온 것인지 밤 이슥한 시간에 그토록 떠나 갈 듯 짖어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놈 검둥아 그만 좀 짖어라, 누운 채 몇 번 나무랐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자 개는 오히려 더 극악스레 짖어댔습니다. 개 짖는 낌새가 이거 심상찮다 싶었는지 아버지는 대충 걸쳐 입고 방문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텅 빈 외양간 앞에 텅 빈 아버지가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계속 아버지를 뒤흔들기라도 하듯 마구 짖어대던 검둥이란 놈이 땅에다가 코를 대며 삽짝 밖으로 냅다 달려나갔습니다. 금세 아버지 앞으로 되달려오면서 미친 듯 짖어대는 거였지요. 그러기를 수차례, 이윽고 아버지가, 알았다, 가자, 하면서 자전거를 꺼내 탔습니다. 검둥이란 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휭하니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검둥이란 놈은 동구 밖을 벗어나자 그때부터 짖지도 않고 가끔 땅에다 코를 대거나 아버지를 기다리거나 하면서 내쳐 적당히 달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달이 기울고 어느 마을 첫 닭이 울 무렵이었을까요, 우리 사는 곳에서 오십리나 떨어진 왜관 인도교에 이르러 마침내 도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고함소리에, 다시 개 짖는 소리에, 혼비백산 한 도둑은
그만 소의 고삐를 놓고 걸음아 날 살려라 줄행랑을 쳤고요. 물론 검둥이란 놈이 한 입에 집어삼킬 듯 도둑의 꽁무니를 향해 돌진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소가, 크고 환하게 몸을 돌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서라 됐다, 일평생 불같았 던 아버지, 캄캄했던 아버지, 들끓었던 아버지가 일순 검둥 이란 놈을 말렸다고 합니다.
동녘 일출을 후광으로 아버지와 소, 검둥이란 놈이 한데 어 우러져 돌아오던 그 아침의, 붉새의 들녘을 기억합니다.
※시인 문인수
- 1945년 경북 성주군 출생
- 1985년 계간 <심상>에 시 ‘능수버들’ 등단 - 2016년 동리목월문학상 외
- 1986년 시집 <늪이 늪에 젖듯>이 다수 - 2021년 졸
오늘 아침 선보이는 시 <심우도>에서도 잘 드러나는 문인수 시인 의 시적 품성입니다. 심우도는 불교에서 비롯된 말이지요. 불교 가 운데서도 문자를 세우지 않고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의 수행단계 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일종의 수행 그림이 십우도인데요, 인간 본성을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심우-견적-견우-득우-목 우-기우귀가-망우존인-인우구망-반본환원-입전수수의 단계를 밟 게 됩니다.
심우는 소를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결행의 단계, 수행자의 첫 마음이니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길지요. 길을 나서지 않고서는 결코 소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 <심우도>에 등장하는 검둥이라는 녀석의 역할 은 참 크다할 수 있지요. 게으름을 쪼개내는 그의 그악스러운 짖음 은 달리 말하면 채근이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지요.
시인 문인수는 늦깎이 시인입니다. 보통 이십대 중초반에 이르 러 자신의 시단을 만들어가는 한국문학의 토대에서 그는 마흔이라 는 나이에 처음 얼굴을 알립니다. 그래선지, 늦은 등단을 보상이라 도 하듯 이후 미친 듯이 시작에 몰두하더니 십수권의 적지 않은 시 집을 발표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유전된 서정과 역사를 간결한 문장으로 드 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작품성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깊고 깊은 시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지요. 그 래서 한국문단은 그를 일러 ‘폐경기를 모르는 시인’이라는 별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