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시의원, 중국 상해 여행기
“스무살 추억이 깃든 상해를 가다"
광양시의원이 되고 지난 1년은 행정업무 파악은 물론, 광영동·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면 등 가장 넓은 지역구의 민원까지 해결하려다 보니 정신없이 흘러갔다. 시의원이 되기 전 2년 역시 선거 준비로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인생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때가 있었나 싶다.
훌쩍 떠나서 숨 좀 돌리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민 없이 떠오른 장소는 딱 하나였다. 그렇게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해로 향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그때의 상해’
상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으니 인연이 벌써 27년이 다 돼간다. 1996년의 상해는 우리나라의 60~70년대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페인트칠도 하지 않은 회색빛 콘크리트 그 자체였다. 그렇게 한두 블록을 지나면 휘황찬란한 빌딩이 갑자기 자리한 도시. 그 모습들은 조화롭지 않은 듯 조화로워 보여서 이상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유명한 곳은 와이탄, 황푸강을 끼고 있는 와이탄에는 상해의 랜드마크 동방명주가 있다. 상해에서 유명한 곳은 쇼핑의 거리 난징루, 상해시청이 있는 인민광장, 그리고 중국식 정원인 예원이 있다. 오래된 옛 기억에서 그 화려함 주변엔 늘 회색빛 아파트, 허름한 건물과 주택이 즐비했다.
랜드마크 동방명주가 보이는 와이탄은 휘황찬란했지만, 동방명주가 있는 푸동은 막 재개발단계였다. 기존의 집이나 건물을 철거하느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현장 그 자체였다. 하지만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에 때론 무섭기도 했다.

5년 만에 ‘다시 상해’
어딜 가도 ‘스마트페이’
5년 만에 상해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스마트페이였다.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일 것인데,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대중화돼 있었다.

길에서 물을 사 먹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택시나 지하철을 타도 스마트페이가 필요했다. 현금으로 먹고, 마시고, 타는 사람이 나 뿐이어서 왠지 외계인이 된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10년 후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아직 결제 수단으로 스마트페이의 대부분을 쓰지만, 중국은 음식점 테이블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택시도 어플을 통해 스마트페이로 선결제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하물며 길에서 버스킹 하는 시민들도 QR코드를 준비해 스마트페이로 후원받을 정도였다. 다시 말하지만 물론 현금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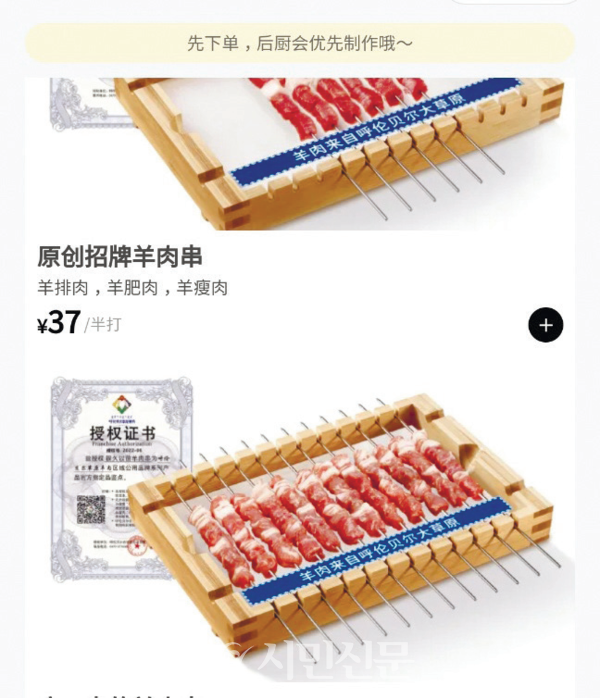
여기서 든 생각이 우리도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을 시행하는데 접목시킬 수 없을까 싶었다. 10% 캐쉬백 효과가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이 전국 최초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토록 모바일플랫폼을 마련한다면 미래를 선도하는 광양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없는 소득을 또 인건비로 쪼개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상해의 빛나는 밤
광양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수십 번을 봤을 동방명주는 상해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다. 1800년대 영국이 조계지로 삼아 유럽풍 건물이 장관인 와이탄을 걷거나, 동방명주와 주변 고층빌딩 야경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보러 오는 관광객은 하루 몇십만 명은 쉽게 넘는다.

랜드마크를 고민하면서 6박7일의 일정 중 4일은 식사를 하던, 차를 마시던, 쇼핑을 하던 시간 날 때마다 난징루와 와이탄, 동방명주 주변을 둘러봤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묻는 질문이 보통 비슷하다.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로 시작할 때가 많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전에는 포스코나 전남드래곤즈를 곁들여 광양을 설명했다.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수와 순천 옆에 있어요”라고 했던 기억이 많다.
지금은 광양을 아는 사람이 전보다는 늘어서 불고기나 계곡 등도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그저 ‘제철소가 있는 공기가 안 좋은 공업도시’ 쯤으로 아는 사람이 더 많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동안 내세울 게 없었나 싶기도 하다.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의원 1년간 수억의 예산이 소요된 여러 사업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랜드마크다. 이순신대교, 구봉산전망대, 도립미술관이 그랬다. 심지어 아직 삽도 제대로 못 뜬 어린이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였다.

나열하기도 너무 많은 사업이 처음은 광양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지금도 랜드마크로 지역의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 광양의 랜드마크는 진짜 무엇이 좋을까? 내가 생각한 답은 야간경관이다. 시의원이 되고부터 꾸준히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동방명주와 그 주변의 야경을 둘러본 이유다.
광양은 배알도와 망덕포구가 있다. 이순신대교가 있고, 옥룡·봉강·어치·금천계곡이 있다. 동천과 서천변이 있다. 이 모든 곳에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일반도로와 가로수까지 점차 넓혀간다면 어느 누가 봐도 빛으로 화려한 도시 이미지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굴뚝마다 오르는 연기로 낮이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제철소의 풍경도 밤에는 그 모습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광양에 필요한 것은 수백 수천억이 들어가는 조형물이 아니다. 공기가 안 좋은 공업도시 이미지의 광양이 아니라, 밤의 풍경이 멋있고 화려한 도시의 광양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다.
광양은 여전히 젊은 도시다. 통통 튀고 생기발랄한 광양시를 그려보고 싶다.
제공=박철수 광양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