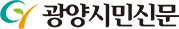특수임무 유공자 조성래 씨
‘무서운 유공자’ 아닌 이웃으로 함께
군에서 익힌 기술로 사회 공헌 봉사
조성래(53) 씨는 광양에 정착한 지 30년 된 시민이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제도적 외면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 대신 지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태극기를 정성스레 달고, 바닷속 쓰레기를 건져내며, 후배 유공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건네는 그의 삶은 말 없이 울리는 애국의 실천이다.

젊음을 건 특수임무, 되돌릴 수 없던 선택
청년 시절, 조 씨는 일반적인 군 복무를 생각하고 입대했다. 훈련만 마치면 공무원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군 관계자의 말은 당시 수많은 청년에게 ‘기회’처럼 들렸다. 하지만 체력 검정 통과 직후, 그는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임무요원으로 차출됐다. 그날부터 사회와 단절된 삶이 시작됐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임무와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전역 후 일상은 불안과 분노, 고립의 연속이었다.
조성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남도지부 지부장은 “숨이 곧 끊어져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훈련 강도는 높았다”며 “제대 후 지인들도 내 눈빛이 무섭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해 점점 외톨이가 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국가를 위해 배운 기술, 이웃을 위해 쓰다
전역 후 조성래 씨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훈련에서 익힌 기술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전남 곳곳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고, 실종자 수색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한다.

또 그는 광양읍 실버주택과 노인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바나나를 전달하고, 국가보훈부가 만든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운동’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유공자 유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 씨는 “혹독한 훈련 탓인지,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례도 많다”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년에 100시간 넘게 봉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특수임무 유공자를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노력과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임무 유공자’라는 이름
법률은 있지만, 예우는 없다
특수임무 유공자는 ‘특수임무 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유공자다. 국가를 위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조 씨는 “법률상 분명히 ‘예우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그 앞에 붙은 ‘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은 무시된다”며 “특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임무 유공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명예 수당 등을 받아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급자 기준을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적은 보상금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명예수당에도 나이 제한을 걸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사람들은 못 받는 경우도 많아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돼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수임무 유공자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가장 힘든 질문은 ‘특수임무 유공자는 어떤거냐’는 질문이다.
그는 “늘 설명해도 6·25나 월남전 참전자만 유공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시민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유공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인식부족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특수임무 유공자들은 외롭고 긴 싸움을 견뎌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는 “그래도 돌이켜보면 특수임무 유공자로 활동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며 “이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래 씨는 “애국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국의 시작”이라며 “특수임무 유공자도 대한민국의 일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조용히 잊혀가고 있지만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래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아직도 조명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삶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살아 있는 역사다. 이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