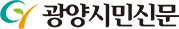방승희 광양문화연구회원
신재 최산두의 고향
성종 13년(1482년) 4월 10일, 봄비가 내린 아침이었다. 광양 백운산 자락 산비탈에는 물기를 머금은 이끼가 짙게 번지고 있었다. 개울에서는 눈처럼 흰 물거품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때 봉강 저곡마을에 큰 울음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백운산에 내려앉은 북두칠성의 정기가 아이에게 깃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산두(山斗)’가 되었다.
봉강의 밤하늘은 늘 은하수로 가득했고, 산두는 여덟 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다. 또한 별빛을 벗 삼아 글을 읽어 스물두 살에 진사에 합격했다. 재능과 덕망을 인정받아 홍문관에 올랐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화순 동북으로 유배된다.

14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김인후, 유희춘 등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 호남 도학의 큰 줄기를 세웠다. 윤구, 유성춘과 함께 ‘호남 삼걸’로 불렸으며, 문집 《신재집》을 남겼다. 현재 광양읍 우산리 봉양사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저곡마을 동북쪽 화전봉 능선 중턱에는 그의 묘가 있다. 묘역 입구의 신도비는 이끼 낀 바위처럼 세월을 머금고 서 있다. 한여름에도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그가 가꾼 학문의 꽃을 닮았다. 묘로 오르는 300미터 길은 짧지만, 한낮의 태양 아래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른다. 바람이 잠든 숲속에서는 칡덩굴이 부서진 나무 계단을 감싸고, 짙푸른 고사리가 사방으로 펼쳐져 묘를 감싸 안고 있다.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고, 묘 옆의 소나무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그를 기리고 있었다.

산 좋고 물 좋고, 사람까지 좋은 마을
묘를 둘러본 뒤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어귀의 개울에서는 물살이 햇빛을 받아 은비늘처럼 반짝였다. 텃밭에 피어있는 보랏빛 도라지꽃은 하늘거리며 춤을 춘다. 뒷산에서 바람에 실려 온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질이는 오후다. 회관 문을 열자 김종현 이장(75세)과 허종양, 허만선, 이종노, 허삼섭 어르신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광양시지에 따르면, 저곡의 옛 이름은 닥실·달실이었다. ‘닫골’이 ‘닥골→닥실→달실’로 변한 것으로 ‘닫골’은 ‘산골짜기 마을’을 뜻한다. 한자 표기로 닥실은 저곡(楮谷), 달실은 월곡(月谷)이라 했다. 닥나무가 많아 닥실·딱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금은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법정리)에 속하며 행정명은 저곡이다.

현재는 벼농사와 함께 감, 밤, 키위, 매실이 주요 소득원이다. 밤나무는 고목이 되어 새로 심는 중이라 한다. 예전에는 120가구였지만 지금은 68가구, 180여 명 남짓, 그래도 한때 봉강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는 자부심은 여전하다.

“저는 이 마을에 들어온 지 8년 됐습니다. 2년째 이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고향은 …” 잠시 머뭇거리자 한 어르신이 웃으며 받았다.
“비행기 타고 가야 해요. 고흥 무인도 출신이랍니다”
웃음이 터졌다. 이장님은 “우청룡 좌백호, 산 좋고 물 좋아서 이곳에 터 잡았어요. 정 많고 인심 좋아 더 바랄 게 없어요”라며 웃었다.
눈치만 봐도 배우는 마을
“우리 마을은 인재가 많아요. 면장만 여섯 분, 변호사 한 분, 조합장 두 분, 시의원, 고시 합격자도 있죠. 인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눈치만 봐도 배울 게 많은 마을이지요.”
“살기 좋아서 장수마을이기도 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합격자도 나왔어요.”
“옛 봉강면장 허상준도 이 마을 김해허씨 후손입니다. 김해허씨가 처음 정착해 우리 마을을 세웠어요.”
마을 앞 ‘말뜰’은 최산두 선생 장례 때 조정 신하들이 말을 매었던 곳이고, 위쪽 ‘책상바위’는 선생이 책을 읽었던 자리라 한다.

또 어린 시절 산두가 재를 넘어 서당을 다녔던 이야기를 전해 준다. 하루는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져 초빈(草殯:덕발)으로 잠시 피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오늘 귀한 사람이 온다. 나는 그분을 호위해야 한다. 훗날 정4품이 될 사람이다” 이 일로 산두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더 학문에 정진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혼인담이다. 옥룡 남정 서씨 집안의 딸과 혼인했으나, 신부가 첫날밤 신랑을 양반이 아니라고 여겨 가까이하지 않았다. 산두는 그 길로 옥룡 학사대로 들어가 10년 공부했고, 결국 ‘산천이 글로 보인다’는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

마을의 과제
이장님은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청년이 없어요.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시급합니다. 전구 갈아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수도꼭지 손보는 게 저의 일상이에요.”
마을 안길 공사와 방송 시스템은 새로 만들었지만, 소화전 설치는 수압 문제로 미뤄졌다. “신재 묘역 길 정비와 제초 작업 지원만이라도 시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봉강저수지 공원화와 연계해 신재 묘역·옥룡사지를 관광 코스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또한 ‘월곡’이라는 옛 마을 이름을 되찾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간절하다.
“월곡은 마을 뒷산의 모습이 떠오르는 달의 모습과 같은 반달형이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전 이름으로 다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다시 월곡이라는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담장 개량과 우물 복원 계획도 있다고 한다. 마을이 깨끗해야 젊은이들도 찾아온다는 게 이장님의 신념이었다. “생태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을 옆 냇가는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장구치고 놀던 곳이잖아요. 예전엔 가재, 다슬기, 미꾸라지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계곡 정비와 하수정화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외치는 이유다.
그대로 사는 기쁨
어르신들의 바람은 단순했다. ‘건강하게, 지금처럼 사는 것.’
“나 스스로 걸어 다니고, 내가 밥 차려 먹고, 아내 귀찮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에 회관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다. 점심시간이 되자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쇼”, “그러쇼”, “이리 오쇼” 국수보다 더 맛있고 다정한 말이 이어졌다.
회관 맞은편 경모정 앞에는 300년 된 푸조나무가 마을을 내려다본다. 나무껍질은 세월의 흔적처럼 푸른 이끼가 붙고, 주름을 새긴 듯 깊게 갈라져 있다.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싱그러운 빛을 만든다.

그늘 아래에는 어머니들이 밀고 오신 보행 보조기가 줄 맞춰 서 있고 경모정 안에는 어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할 일 다했으니 죽기만 바란다”는 농담 속에서도 “우리 마을만큼 좋은 데 없어”라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정자나무 있지, 졸졸 개울 있지, 제일 좋아” 큰 마을이 지금은 반으로 줄었어도, 아침에 나와 놀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집이 있고, 내일 아침 또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하신다.
두 그루의 나무
경모정 푸조나무 앞에서 북쪽을 보면 저만큼 깔딱고개라고도 부르는 달재에 200살 느티나무가 보인다. 나무 옆에는 오가는 사람들 쉬어가는 정자도 있다. 그곳에서 허리도 펴고 바람도 쐬다 간다. 마을 안과 밖에서 두 그루의 보호수가 묵묵히 마을을 지킨다.

몸을 왼쪽으로 틀면 화전봉이 보인다. 그곳이 신재 최산두의 묘역이다. 어르신들은 묘로 바로 가는 길이 나길 바란다. 계단이든 산길이든 좋다. 광양의 인물, 최산두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라도 기리고 싶은 것이다. 마을 골목 이름이 ‘최산두길’인 것도 같은 마음이다.

마을길을 걷다 보면 샘솟는 우물과 오래된 흙 돌담이 나타난다. 퐁퐁 솟아 흐르는 우물물은 더위를 씻어주고, 울퉁불퉁 돌담은 고향집을 마주한 듯 정겹다. 대문 옆에도 주렁주렁, 밭에도 주렁주렁, 키위 열매가 바람에 흔들리며 익어간다. 달콤새콤 맛과 향을 능소화가 먼저 알았는지 담장 너머로 주홍빛 손을 자꾸 내민다.

500여 년 전 선비의 정신을 품고, 변화를 모색하며 살아가는 마을. 역사와 인정이 함께 숨 쉬는 저곡마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두 그루의 나무가 오늘도 바람결에 속삭인다.
글·사진=방승희 광양문화연구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