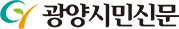광양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이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루고 돌아오고 싶어 할 때, 고향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광양에는 그들이 문을 두드릴 ‘집’, 즉 광양시립박물관이 없다.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이 평생 이룬 유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도, 그 유물을 품어줄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 답답함 속에서 ‘광양문화지기’와 ‘광양지역사연구회 마로희양’ 회원들은 길을 나섰다. 광양의 유물과 인물들이 타지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번 답사는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나주 동신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그날은 약간 흐린 날씨였고, 가을비가 간간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광양의 과거를 찾아 나섰다.
‘돈탁이’가 머무는 곳, 목포대박물관
첫 방문지는 무안에 있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이었다. 이곳에는 2011년 광양 오사리 돈탁마을 패총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개’ 유골, 일명 ‘돈탁이’가 전시돼 있었다. 광양사를 공부하며 ‘돈탁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머릿속의 한 단어에 불과했는데, 눈앞에서 실제 유골을 마주하니 그 감동은 새로웠다. 조개무지 속에서 발견된 그 오랜 시간의 흔적은, 오래전 광양 사람들의 삶과 온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회원들은 신석기시대의 개 한 마리가 오랜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남아준 사실 자체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광양의 피붙이 같은 존재”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5천 년 이상의 세월을 광양에서 보낸 ‘돈탁이’를 광양이 아닌 타지에서 봐야 하는 현실은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아울러 ‘돈탁이’를 조개무지 속에서 발굴해 그에게(돈탁이는 수컷을 상징하는 유골도 남아 있었음) 이름을 지어 주고,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개 발에 땀 나도록 맹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목포대박물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날 친절하고 세련된 전문지식으로 광양 답사팀을 안내해 준 김세종 학예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경모 사진작가의 숨결이 깃든 곳
동신대 이경모카메라박물관
이어서 찾은 나주 동신대학교에서는 광양 출신의 자랑, 이경모 사진작가의 유품이 가득한 이경모카메라박물관을 관람했다. 그의 손때 묻은 카메라들과 필름, 취재 수첩은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낸 그의 사진들은 그 자체로 삶의 역사책이었다.

그가 평생 모은 1400여 점의 방대한 카메라 중 일부가 전시돼 있는 박물관은 마치 ‘기록의 성전’ 같았다. 그러나 이 또한 광양이 아닌 나주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다.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경모 선생이 수집한 카메라도 광양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의 시선과 열정은 광양의 정신이자,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최근 목포대는 이경모카메라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이경모 사진작가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당일 우리 답사팀을 안내해 준 허용무 관장님의 겸손하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에 존경을 드린다. 그리고, 접빈객(接賓客)의 예를 다하기 위해 경북 안동에서 나주까지 4시간 이상을 달려와 우리를 환영해 주신 이경모 작가의 아드님, 이승준 선생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타지의 전시실에서 만난 광양의 얼굴
우리는 지난해에는 광주박물관에서 중흥산성쌍사자석등, 올해는 목포대박물관에서 돈탁이, 나주 동신대박물관에서 이경모 선생의 카메라를 만났다. 세 곳 모두 광양의 이름이 깃든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유물의 고향, 광양입니다”라는 안내문은 없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같은 바람이 일었다.
“이제는 이들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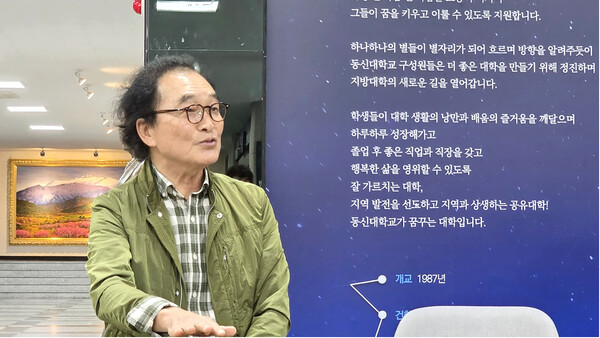
이날의 답사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다. 광양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밖에 너무 오래 두었다는 자책, 그리고 그들을 하루빨리 품에 안아야 한다는 간절한 다짐의 여정이었다.
회원들은 “광양도 이제 밖에 있는 지역 유물을 우리 곁으로 오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광양 시정을 결정하는 분들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했다.

문화 도시 광양의 상징
광양시립박물관
광양은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문화의 온기가 부족하다. 지역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자 후손에게 전할 문화의 집, 그것이 바로 광양시립박물관이다.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광양의 역사와 인물 ·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아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의 거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중흥산성쌍사자석탑과 돈탁이, 그리고 이경모 선생의 카메라가 함께 놓여 광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의 대문’이 되기를 바란다.
광양의 아들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때, 이제는 따뜻하게 그 문을 열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고향이 후손에게 내미는 손이며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다.
하루빨리 광양시가 이 염원을 실현하여 ‘문화 도시 광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광양시립박물관 건립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제공=김논쇠 광양문화지기 대표, 조경녀 광양문화지기 사무국장 , 이은철 광양지역사연구회 대표, 허미혜 광양지역사연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