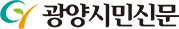산림 통계 미갱신·관리 공백 지속
화재 및 토양유실 위험 커져
시민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
광양 대나무 숲에서 집단 고사가 이어지면서 화재와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태 조사와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양 옥룡, 진월 등 곳곳에서 하얗게 마른 대나무가 집단 고사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조성된 백운산 추동섬(웃섬) 생태공원에서는 산책로를 따라 대나무 고사목이 뒤엉켜 관리되지 않은 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대나무는 뿌리줄기로 번식하기 때문에 일부가 고사하면 주변 개체로 번져 군락 전체가 붕괴된다. 문제는 이를 방치할 경우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화재와 토양유실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사한 대나무는 내부 수분이 적어 불에 잘 타며, 낙엽층과 쓰러진 줄기가 쌓이면 바람을 타고 불이 급속히 번질 위험이 크다. 뿌리 부패로 지반이 약해지면 토사가 유출돼 주변 농경지와 도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광양 봉강 구서리 대나무 숲과 진월 인근 대나무 숲에서 두 차례 산불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완주, 부산,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3년 전남 장성군에서는 대나무 숲 화재로 주택 4채와 비닐하우스, 임야 0.5ha가 소실됐으며, 2024년 전남 해남 대나무 화재로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대나무 집단 고사 현상은 2022년 이후 경남·전남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나무 주기설(60~120년 주기적 고사)’과 더불어 뿌리 얽힘으로 인한 양분 부족, 동해, 가뭄 등 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전국적으로 대나무 고사가 잦아졌다”며 “예전에는 생활용품 원료로 활용돼 관리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관리가 중단돼 뿌리가 얽히고 영양분이 고갈되면서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나무 뿌리는 지상 50cm 아래까지 퍼져 있어, 군락이 죽으면 지반이 약해지고 쓰러진 대나무가 주변 시설물이나 도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보통 지자체는 고사목을 벌채해 새 대나무가 자라도록 관리하는데, 뿌리를 남기고 줄기만 제거하면 빠르면 3년~5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지역 내 대나무 고사 현황뿐 아니라 전체 죽림 면적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산림 통계에 ‘죽림’ 면적을 포함해 조사해야 하지만, 광양시는 2020년 기준 240ha로만 기록된 이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진안군은 2021년 인근 대밭 화재 발생 후 ‘대나무밭 동해 피해에 따른 산불 위험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지자체의 산림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실태 조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 “광양 경찰서 사거리 일대에서도 고사한 대나무가 쓰러질 듯 기울어 있어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불안하다”면서 “또 최근 큰 화재 피해를 겪은 만큼,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새로운 산림 조성 예산보다 기존 산림 보호 예산과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